|
가을벌초를 하면서
정재학 시인 . 칼럼니스트
부모님 산소에도 만추(晩秋)의 쓸쓸함이 낙엽과 함께 쌓인다. 작은 풀 하나까지 악착스런 생명으로 살아남기를, 경쟁하고 다투던 지상(地上)의 모든 것들이 호흡을 거두고 멈춰 서있다.
벼를 벤 들은 참으로 허전한 공간으로 남아있다. 가시덤불 사이 사는 작은 새들 아니면, 산봉우리 높은 곳 위를 날아오는 북녘 새들 외에 날개 있는 것들은 모두 남쪽으로 떠났다. 귀뚜라미 소리 또한 그쳐 있다.
어머니, 산소 묘비를 쓸어본다. 잔디 몇 포기가 솟아난 것을 낫으로 베고, 풀을 치운다. 추석 후에도 풀을 벴으니, 더이상 풀 벨 것은 없다. 다만 눈 내리기 전 , 어머님 산소에 따뜻한 손자국을 남기고 싶었을 뿐이다.
겨울이 오면, 얼마나 추우실까. 찬바람 일어나는 들판에 사람그림자 없는 적막함이 또한 얼마나 견디기 힘드실까.
부모님 생전 그토록 불효하던 가슴이 찌른 듯 아파온다. 젊은날에도 효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그때는 이토록 애 끊는 정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었다. 돈과 명예, 권력과 부(富)보다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더 소중히 여겼었다. 선택에 대한 의지를 더 깊이 생각하였던 피 끓는 날들이었다.
사랑하고 놓아주고, 미워하고 싸우던 것이 자유로움의 전부였다. 부모님에 대한 효(孝) 역시, 이제는 하나뿐인 선택으로 남았다. 세상의 일이 끝나가는 지금부터 효를 해야 할 때인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 풀 한 포기를 걷으면서도 쓰라린 한숨이 솟는다. 다시 태어나면 인간으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 어떤 생명으로도 다시 사랑하고 번식하는 일생으로 살고 싶지 않다.
말없는 돌장승, 어머님 곁 문인석에 스며들어 산소 곁에서 천년을 있었으면 한다. 아니면 시비(詩碑) 하나 세워서 부모님 곁에 무궁한 세월, 예쁜 시(詩)를 읊어드리며 천년을 지냈으면 한다.
마음대로 살아온 자유로운 영혼이 날개를 접고 부모님 곁에 있고 싶은 마음. 이제는 떠나지 않고, 날지도 숨쉬지도 못하는 돌로 남아 어머님 곁에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영혼일지라도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싶다.
항상 그렇듯이 턱을 괴고 부모님 산소에서 석양을 맞는다. 산소까지 따라온 강아지 반자도 말없이 앉아있다. 망부석처럼 그냥 앉아서 주인을 지켜보고 있다.
산소 안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반달이라는 강아지도 누워있다. 강아지 반자도 죽으면, 이곳에 묻힐 것이다. 어느 떠도는 영혼이 이곳을 찾아오더라도, 생전처럼 번함없이 반달이가 짖고 반자가 짖어줄 것이다.
돌아오는 길. 사람 형용을 한 불효(不孝)한 그림자 하나와 주인을 따라오는 강아지 그림자 하나가 있다.
2023. 11. 9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png)



7788.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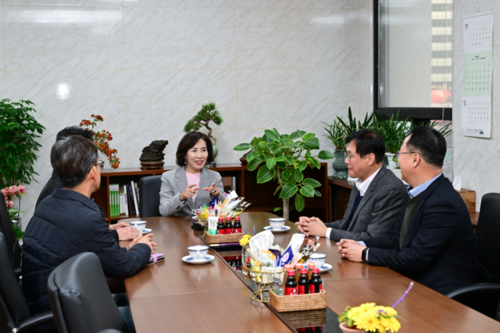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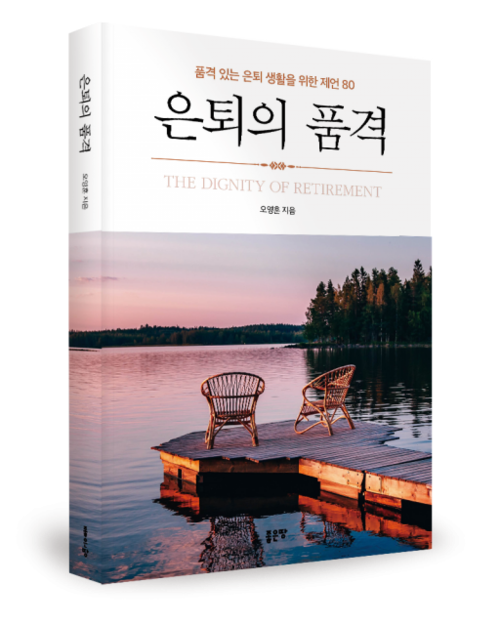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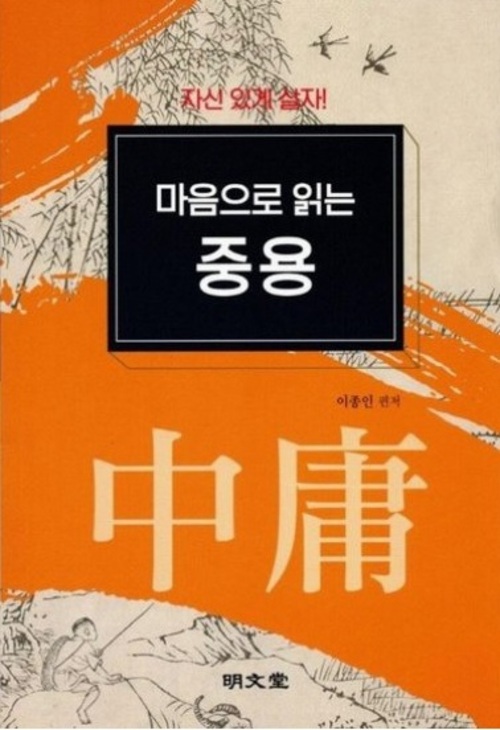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