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균ㅣ한국효문화진흥원 문화연구단장
보통 국가나 군주에 대한 국민과 백성의 도리를 충이라 하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효라고 말한다. 비록 충개념이 진심을 다한다는 개인적 자세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군주와 국가에 대한 충성개념으로 변질되었다면 국가적, 공적 범주에 해당하고, 효는 가정적, 개인적 범주에 속한다. 여기서 동양적 개인-가정-국가로 이어지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질서와 “효자집안에 충신난다”는 얘기도 나왔다. 문제는 가정에서의 효와 국가에서의 충이 충돌할 때의 일이다.
19세기 후반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 실시는 전국의 의병을 불러일으키는 촉발제가 되었다. 날로 몰락하는 나라구하기 운동에 백성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인영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인영의 발목을 잡은 것은 심상치 않았던 부친의 병세였다. 나라의 운명도 부친의 운명도 촌각을 다투고 있었다. 그를 지도자로 추대하려는 무리가 “국가의 일이 급하고 부자의 은(恩)이 경한데 어찌 공사를 미루리오.”라며 설득하자, 이인영은 1907년 부친과 작별하고 의병 총지휘관으로 서울 진공작전에 나섰다. 산발적이었던 곳곳의 의병들을 모아 의병연합부대를 결성하고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이 된 이인영은 부대를 정비하고 서울로 진격 작전을 펼치고 있을 때 부친 사망소식이 전해졌다. 이인영은 충과 효의 갈림길에서 고민했다. 그리고 효의 현장 고향집으로 달려갔다. 이후로 의병부대는 퇴각하였고 결국 패하고 말았다.
효의 현장으로 달려간 이인영은 부친 삼년상을 치르다 그만 일제 헌병에 잡혔다. “어찌 전장의 최고 지휘관이 부친이 돌아갔다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헌병의 비아냥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짐승과 같고 짐승은 신하가 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이 불충인 것이다.”고 당당히 답했다. 공적 책임자가 사적 업무로 자리를 뜰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인간의 당연한 도리가 공적 업무의 기본이 된다는 효우선의 논리로 응수한 것이다.
전혀 다른 사례도 있다. 세종 때 김종서 장군 얘기다. 장군은 두만강 동북지역에서 여진족을 정벌하고 국경에 6진을 설치, 오늘날의 국경선을 정립한 인물이다. 장군은 오랜 세월 최전방지대에 있으면서 효를 다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겼다. 마침 노쇠한 모친 봉양을 위한 사직 상소를 올렸지만 세종은 국방의 위중함을 들어 허락하지 않았다. 그 때 세종은 단지 충을 우선하며 효를 무시한 게 아니었다. 장군의 모친에게 직접 약과 음식을 내려 치료하도록 선처하였다. 충신의 효를 나라에서 대신한 것이다.
최전방에 있던 장군이 잠시 휴가를 내어 모친 병환을 돌보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모친은 “너는 빨리 네 직책에 돌아가라. 네가 능히 성상께 충성을 다한다면 나는 비록 죽더라도 유감이 없을 것이다.”고 하며 아들을 돌려보냈다. 어머니의 이 말은 충과 효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던 장군의 마음을 다잡아주었다. 나라의 중차대한 책무를 맡고 있는 신하가 충성을 다함은 마땅한 도리이다. 하지만 병든 모친 봉양을 뒤로 한 채 국경으로 달려가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자녀의 도리 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이 때 어머니의 “돌아가라”는 이 한마디 말은 충효를 아우르는 결단이었다. 돌아가는 것이 나라에 대한 충이고 자신에 대한 효라는 것이다. 결국 모친의 이 한마디는 세종(王), 어머니(母), 김종서(子) 삼자의 미묘한 충효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아우르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충과 효,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일까? 상황 따라서 달리봐야하지 않을까? 핵심은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충과 효에는 피아(彼我)가 있다. 본인도 중요하지만 상대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와 군주, 국가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우선인가 분명해 진다. 부모입장에서 전장을 등지고 고향 길을 택한 지도자의 선택, 과연 부모가 반겼을까? 아니면 “(현장으로) 돌아가라” “나라위해 끝까지 싸워라” 라고 했을까? 6월 호국보훈의 달, 한번쯤은 생각해볼 일이다.
<저작권자 ⓒ 실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png)



7788.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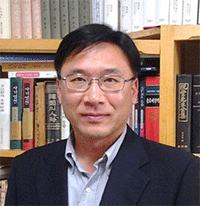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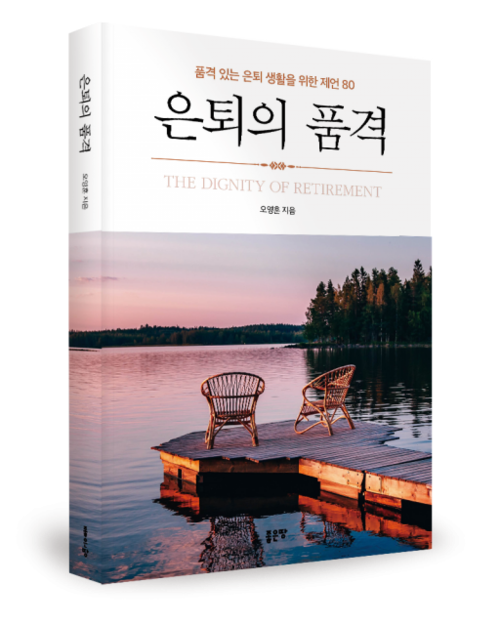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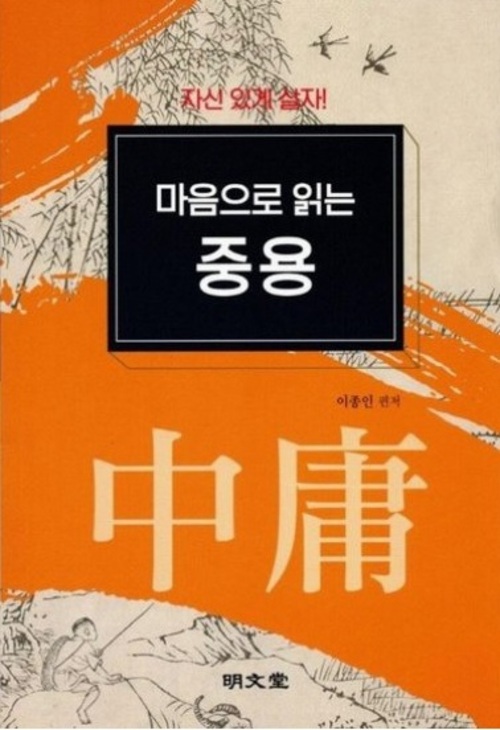



.png)

